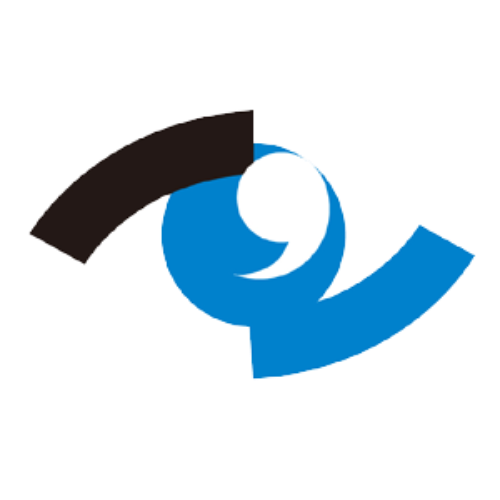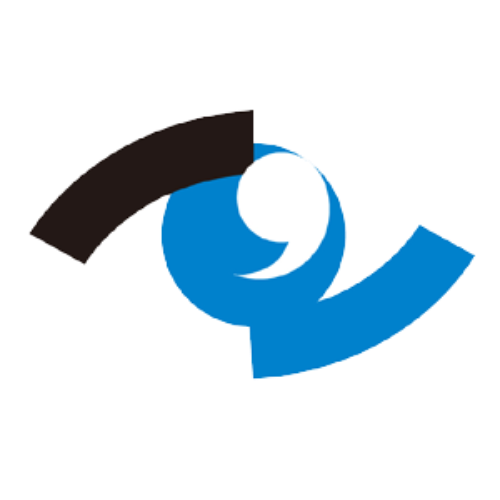한여름의 숨 막히는 더위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음력 7월, 그 가운데 15일은 ‘백중(百中)’입니다.
이날은 마을마다 들썩이는 꽹과리 소리와 함께 잔칫상이 펼쳐지곤 했다고 하는데, 지난주 세시풍속 논고사제, 백중놀이 보전 재현행사가 춘천 사암2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논고사제를 시작으로 사암리농악보존회가 풍악을 울리며 길을 따라가는 길놀이를 통해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흔히 백중은 불교에서 유래한 조상 공양의 날로 알려졌지만, 민속적인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날은 단순한 제삿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수고를 기억하며, 공동체가 숨을 고르던 날이라 더 마음이 쓰이는 날입니다.
백중(百中)의 이칭으로는 백중(白中), 백중(百衆), 백종(百種), 백종절(百種節), 중원일(中元日), 망혼일(亡魂日) 등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은 ‘머슴날’이라고 합니다.
머슴이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만큼이나 삶을 함께했던 존재였습니다. 한 해 농사가 한창 고비를 넘는 시점, 뜨거운 햇볕 아래 논두렁을 밟고 땀으로 하루를 견디던 머슴들께 이날만큼은 새 옷 한 벌, 고깃국 한 그릇, 막걸리 한 사발이 돌아갔습니다. 머슴도 사람이니, 이날만은 주인과 머슴이 함께 웃었습니다.
힘겨운 일상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보던 날이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백중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식탁 위에 오르던 한국적인 감사절이라 하고 싶네요.
또 백중날에 민속놀이가 빠질 수 없습니다. 마을마다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함께 즐기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줄다리기, 씨름, 풍물놀이가 열리고, 머슴끼리 ‘힘자랑 씨름판’도 벌어졌습니다. 이긴 머슴은 소 한 마리 값을 상으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상도 결국 마을 어귀 주막에서 나누어 마시며 웃음으로 흘려보냈지요. 백중이 주는 푸근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위나 위계가 아닌, 땀의 무게를 서로 나누던 연대의 마음에서요.
하지만 오늘날 백중은 조용한 절간에서 기도문 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머슴은 사라졌고, 농사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노동의 수고를 기억하는 날조차 달력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게 됐죠.
오늘날의 머슴은 누구일까요? 배달가방을 멘 청년일 수도 있고, 무더위 속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머슴일 수 있죠. 백중의 민속적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밥, 수고하셨다는 말, 그리고 함께 웃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누구든지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잊히기엔 너무 따뜻했던 날, 백중. 다가오는 올해 백중에는 조용히 되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참 수고하셨어요” <김영희 디지털콘텐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