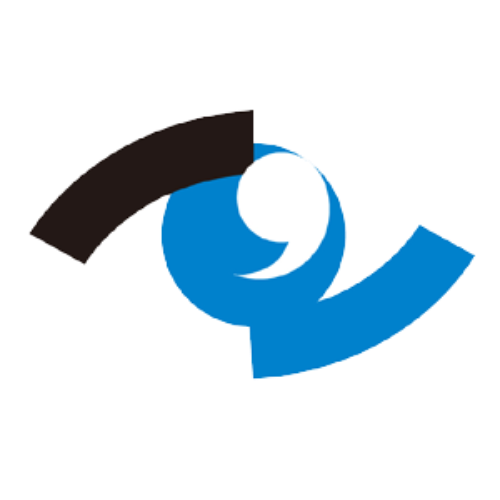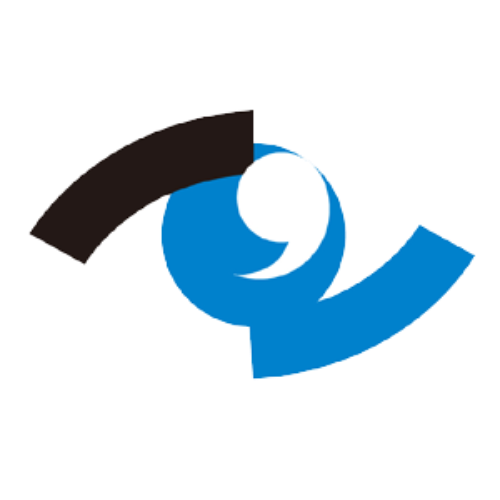검루(黔婁)는 중국 노(魯)나라의 은사(隱士)입니다. 도를 지키며 가난하게 살았다고 전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증자(曾子·기원전 505년~기원전 435년)가 문상을 갔다고 합니다. 빈소를 가만히 살펴보니 주검을 덮은 헝겊이 모자라 고인의 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증자가 “헝겊을 비스듬히 하면 다 덮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죠.
검루의 아내가 답했습니다. “비스듬히 하여 넉넉한 것보다 바르게 하여 모자라는 것이 낫습니다(斜而有餘 不如正而不足). 선생은 살아서도 비스듬히 하지 않았는데 죽어서 비스듬히 하는 것은 고인의 뜻이 아닙니다.”
증자가 선뜻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곡을 다한뒤 “고인의 시호(諡號)는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검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평생토록 평안했으니 강(康)이라고 정할까 합니다.”
증자가 놀라 “선생께서는 생전에 먹고 입는 것이 충분치 않았고 영화를 누리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강’이라고 하시려는 것입니까?”하고 반문했습니다.
검루의 아내가 답했습니다. “남편은 벼슬도 마다하고 군주가 내린 곡식도 마다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부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인(仁)을 구하여 인을 얻고, 의(義)를 구하여 의를 얻으셨으니 시호를 ‘강’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지요?”
증자가 속으로 ‘그 남편에 그 부인이구나.’하고 검루의 아내를 다시 봤다고 합니다.
이 고사는 중국 유향(劉向·기원전 77년~기원전 6년)이 지은 열녀전(烈女傳)의 검루처(黔婁妻)에 전합니다.
중국 동진(東晉)의 도연명(陶淵明·365~427년)이 자전인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썼습니다. 자신의 본모습과 이상을 결합해 제시한 자화상이라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을 검루에 비겨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검루에 관한 말이 있으니 ‘빈천에 근심하지 않고, 부귀에 급급하지 않았다(不戚戚於貧賤, 不汲汲於富貴)’고 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도연명 자신)은 검루의 무리임을 말한 것이리라.”
빈천은 똥처럼 여기고 부귀는 금처럼 떠받드는 세상에 어디 검루(黔婁)와 검루처(黔婁妻)가 있겠습니까? < 남궁창성 미디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