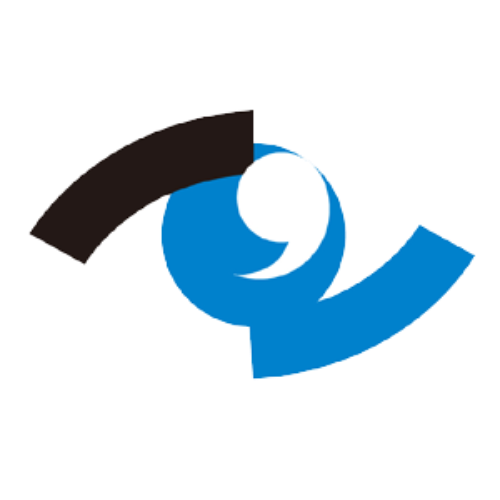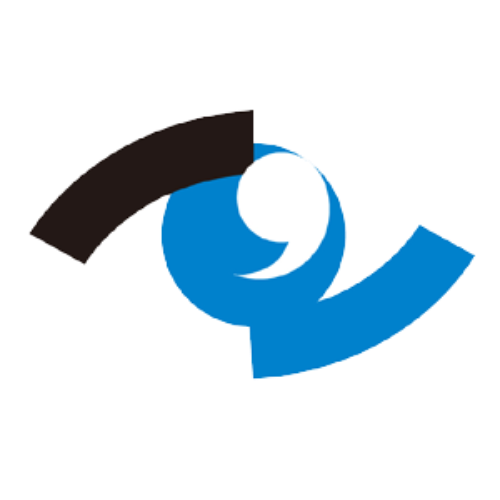물의 고향, 수국(水國)에서 나고 자란 기자는 늘 강과 호수가 그립습니다.
서울 생활 17년 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을 출발한 열차가 당산역을 향해 달리다 한강철교를 올라타는 찰나, 눈 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큰 강은 콘크리트 정글의 갑갑함을 떨쳐 내게 했습니다. 강 위를 흐르는 밤섬과 행주산성이 한 눈에 들어오면 몸과 마음은 날아 올랐습니다.
한강은 조선시대에 경강(京江)으로 불렸습니다. 그 시절의 한강은 남산을 끼고 도는 한강진(漢江鎭) 주변의 강줄기였습니다. 용산지역은 용산강(龍山江), 마포 일원은 서강(西江), 김포와 통진 지역은 조강(祖江)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은 1년 동안 1만여 척 이상의 배가 전국의 세곡과 물산을 싣고 오가는 유통의 허브였습니다. 또 나라와 백성이 원하는 것을 축원하는 기도처였습니다. 영험한 용신(龍神)이 머무는 곳으로 인식됐죠. 기우(祈雨), 기설(祈雪), 기한(祈寒) 등을 비는 제사는 한강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우제는 광진, 저자도, 한강, 용산강 등에서 거행됐습니다. 제사는 비가 올 때까지 열두 차례 계속됐던 것입니다. 1차는 한강에서 당상관 관리를 보내 지냈습니다. 2차는 저자도와 용산강에서 재상이 주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차례 제사를 지내면 한 주기가 끝났습니다. 이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반복해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6차에는 한강에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근시(近侍)를 보냈습니다. 이때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던져 넣는 침호두(沈虎頭)를 거행했습니다. 9차에는 중국 사신을 접견하던 모화관(慕華館) 연못에서 석척동자(蜥蜴童子)들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동자들은 도마뱀을 잡아 항아리에 넣고 막대기로 두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강에 용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용이 하늘을 날고 움직이면 비구름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강물에 호랑이 머리를 던져 용을 자극하고 흥분시켜 하늘로 날아 오르게 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용에게 비를 간절하게 빈 것이 아니라 무엄하게 용의 화를 도발한 것입니다. 침호두는 고종 36년 1899년까지도 거행됐다고 합니다.
도마뱀은 상상의 동물인 용과 모습이 비슷합니다. 용이 산다고 믿는 물가에서 도마뱀을 항아리에 잡아 넣고 화나게 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올 여름 하늘은 시도 때도 없이 비를 만들어냈습니다. 맑았다 싶으면 비가 오고, 비가 내리나 싶으면 햇볕이 쨍쨍 내리쬤습니다. 도마뱀과 용을 굳이 화나게 할 일이 없었죠. 그 옛날 한강물에 호랑이 머리를 던져 넣고 경건하게 올리던 기우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였던 셈입니다. <남궁창성 미디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