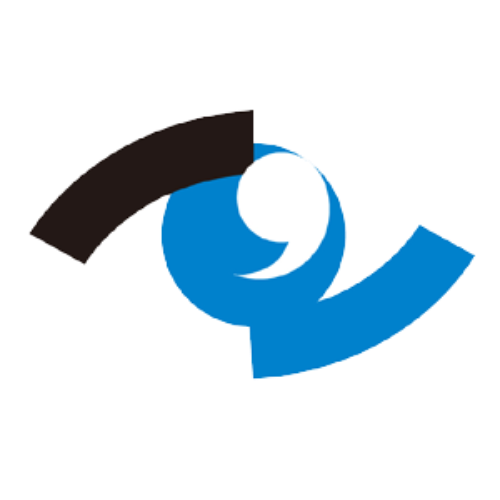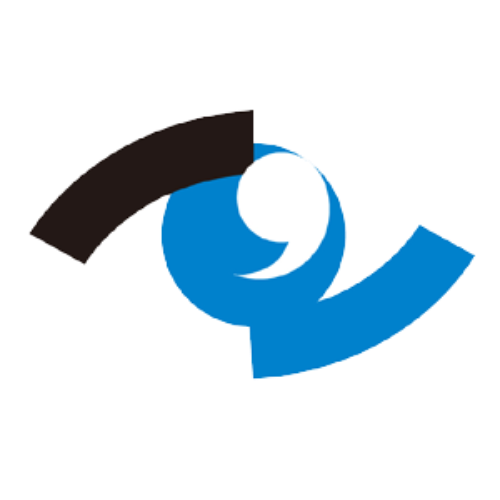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침묵을 좋아하는 이’라는 묵호자(默好子)를 호(號)로 쓴 선생은 1582년(선조 15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증광 문과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에 임명돼 왕세자인 광해군에게 글을 가르쳤죠. 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평양까지 호종했으며 벼슬은 황해도 감사, 도승지, 한성부 좌윤, 대사간 등을 지냈습니다. 사색당파의 나라에서 북인(北人)에 속했지만 붕당 자체에 회의적이어서 당파를 초월해 교류했다고 합니다.
1623년 4월 인조반정후 광해군의 복귀를 꾀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아 양주(楊州) 서산(西山)에서 체포돼 그해 8월 아들과 함께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실학자이자 고증학자인 이긍익(李肯翊·1736~1806년)이 쓴 역사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이 전하는 유몽인 선생의 최후입니다.
국문을 맡은 정승 “너는 어찌하여 역적 모의를 했으며, 또 왜 망명했느냐?”
유몽인 “광해가 망하는 것은 아낙이나 어린 아이도 다 아는 일이다. 또한 새 임금의 거룩한 덕은 천한 종들도 다 아는 일인데 내가 어찌 성군을 버리고 못난 임금을 복위시킬 뜻이 있겠소? 또 나는 망명한 것이 아니고 서산에 갔던 것뿐이오.”
정승 “네가 서산에 갔다는 말은 나도 안다.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세워 임금을 삼았다면 백이(伯夷), 숙제(叔齊)가 서산에 갔겠느냐?”
유몽인 “내가 전에 늙은 과부의 노래(孀婦詞)를 지어 내 뜻을 전했는데 이것이 죄가 된다면 죽어도 할 말이 없소.” 그리고 ‘상부사’를 읊어 나갔다.
“칠십 먹은 늙은 과부 / 단정하게 살면서 빈 방을 지키네 / 옆 사람들이 다시 시집가라고 하네 / 남자는 얼굴이 꽃처럼 잘 생겼다고 하지 // 시문을 자주 외웠고 / 역사도 조금은 알고 있으니 / 흰 머리 거짓으로 젊게 꾸민다면 / 어찌! 연지분이 부끄럽지 않으랴.”
여러 대신들이 선생을 살려주자고 했지만 새 정권의 권신(權臣)들은 후환이 두려워 끝내 죽였습니다.
그리고 171년이 흘렀습니다. 사관은 정조 18년(1794년) 5월12일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정조(正祖)의 어명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유몽인의 일은 천한 종이나 아낙들도 모두 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속일 수 없는 공론이다. 남의 신하가 되어 몸을 버리거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절의를 지키자는 의도는 같지만 어느 한쪽을 택함에 있어 그 난이도는 다르다. 유몽인도 어찌 어렵고도 어려운 입장이 아니었겠는가. 혼조 때에는 정도를 지키느라 자취를 감췄고 반정 뒤에는 천지가 밝아졌어도 절의를 굽히지 않았다. 떳떳한 분수에 조금의 하자도 없다. 그동안 한을 풀어주자는 논의가 금지된 것은 길재(吉再)·김시습(金時習)을 관용하던 성조(聖祖)의 뜻이 아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유몽인의 신원을 시행하라.” <남궁창성 미디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