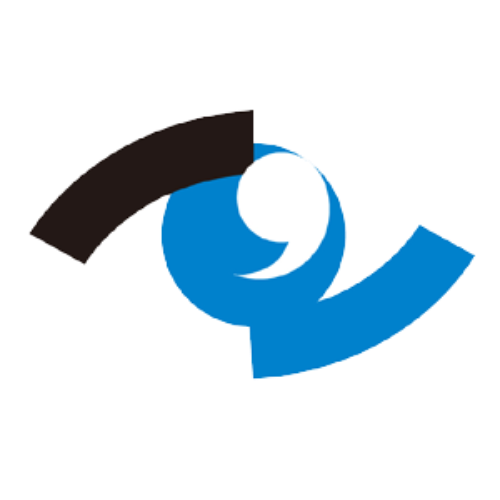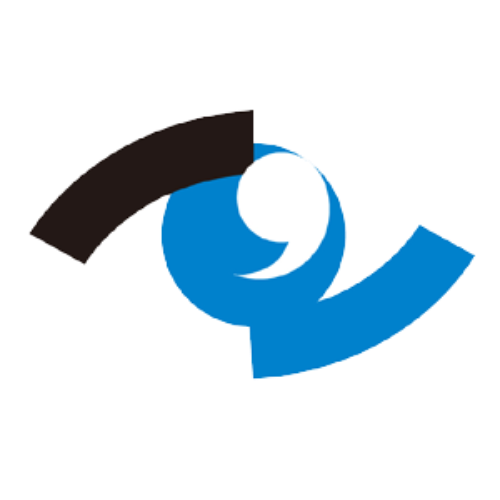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인(士人) 석주(石洲) 권필(權鞸·1569~1612년)이 이 사건을 소재로 시를 지었다. ‘임숙영의 삭과 소식을 듣고서’.
‘궁궐에 푸른 버들 가득하고 꽃잎은 어지러이 날리는데(宮柳靑靑花亂飛) / 성안의 벼슬아치들 봄볕에 아양 떠네(滿城冠蓋媚春輝) // 조정에선 입 모아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노래하는데(朝家共賀昇平樂) / 누가 포의의 입에서 위태로운 말이 나오게 했나(誰遣危言出布衣).’
시가 화제가 되니 ‘궁류(宮柳)’라는 두 글자에 대해 사람들은 외척 유가(柳家)로 여겼다.
역린(逆鱗)을 자초한 권필은 누구란 말인가?
1601년(선조34년) 10월 1일 중국 황제가 사신을 파견해 황태자 책봉조서를 보냈다. 조정은 대제학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1564~1635년)를 원접사로 삼았다. 월사는 이조정랑 박동열(朴東說), 예조정랑 이안눌(李安訥), 이조좌랑 홍서봉(洪瑞鳳)을 종사관으로 임명하고, 권필을 뽑아 제술관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백의 종사(白衣 從事)’라 했다.
권필의 글과 시는 목릉성세(穆陵盛世)라는 당시 조선은 물론 중국까지 필명을 날렸다. 석주의 궁류시(宮柳詩)는 임숙영 사건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조정에 다시 파란이 일었다.
1612년(광해군4년) 4월2일. 왕은 권필을 직접 국문하고 나섰다.
광해군 = “권필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런 시를 지어 멋대로 비난한단 말인가? 임금을 무시하는 부도(不道)한 죄가 매우 크다. 추문해야 한다.”
권필 = “임숙영이 전시(殿試) 대책에서 미치광이 같은 말을 했으므로 신이 이 시를 지은 것인데 대의(大意)는 ‘좋은 경치가 이와 같고 사람마다 뜻을 얻어 잘 노닐고 있는데 숙영이 포의로서 어찌하여 위험한 말을 한단 말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궁류(宮柳), 두 글자는 당초 왕원지(王元之)가 전시 때 지은 시인 ‘대궐 버들이 봄 아지랭이 속에 휘휘 늘어졌네.(宮柳低垂三月烟)’라는 글귀를 취한 것인데 사람들은 유(柳)자를 가지고 외척을 가리킨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해군 = “궁류가 외척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른 대로 고해야 한다.”
권필 = “신은 경치에 대해 말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 외척을 가리킨 것이라고도 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형신을 가하라고 명하자 대신들이 고했다.
영의정 이덕형·좌의정 이항복 = “지금 국문하는 사람들은 그 죄명이 역적의 죄와는 다르고 단지 경박한 무리들이 시사에 대해 비난한 것에 불과합니다. 궁궐에서 친국하는 것도 미안한 일인데 형추까지 하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교관을 지낸 적이 있지만 유사(儒士)이니 역적의 옥사가 끝난후 처치하소서.”
왕이 곤장을 치며 신문할 것을 재촉했다. 이덕형·이항복 등이 재삼 구원했으나 왕은 따르지 않았다. 준장(准杖)을 치고 가두었다. 이날 밤 광해군의 노여움이 한풀 꺾였다. 왕은 “권필의 부도죄는 엄한 형신을 가하여 신문해야 하지만 대간의 말을 들어 형벌을 면제하고 귀양보낸다.”
유배지는 함경북도 경원(慶源)으로 정해졌다. 그는 몸이 약했다. 혹독한 곤장에 쓰러져 들것에 실려 동대문을 나갔는데 곧이어 죽었다.
권필은 송강(松江) 정철(鄭澈·1536~1593년)의 문인이다. 또한 교산(蛟山) 허균(許筠·1569~1618년)의 절친이다. 19세에 초시와 복시에서 모두 장원을 했다. 그러나 글자 하나를 잘못 적은 일로 내쫓김을 당하자 술과 시로 세월을 보냈다.
선조가 그의 시 수십 편을 읽고 가상히 여겨 벼슬을 내렸다. 참봉에 제수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다시 동몽교관에 임명하니 잠시 나갔다가 곧바로 버렸다. 세상은 선비 가운데 제1의 사인으로 받들었다. 권필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한때는 시로 왕의 사랑을 받아 벼슬을 얻었지만 또 한때는 시로 왕의 노여움을 사 목숨까지 잃었으니 많은 선비들이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 <남궁창성 미디어실장> |